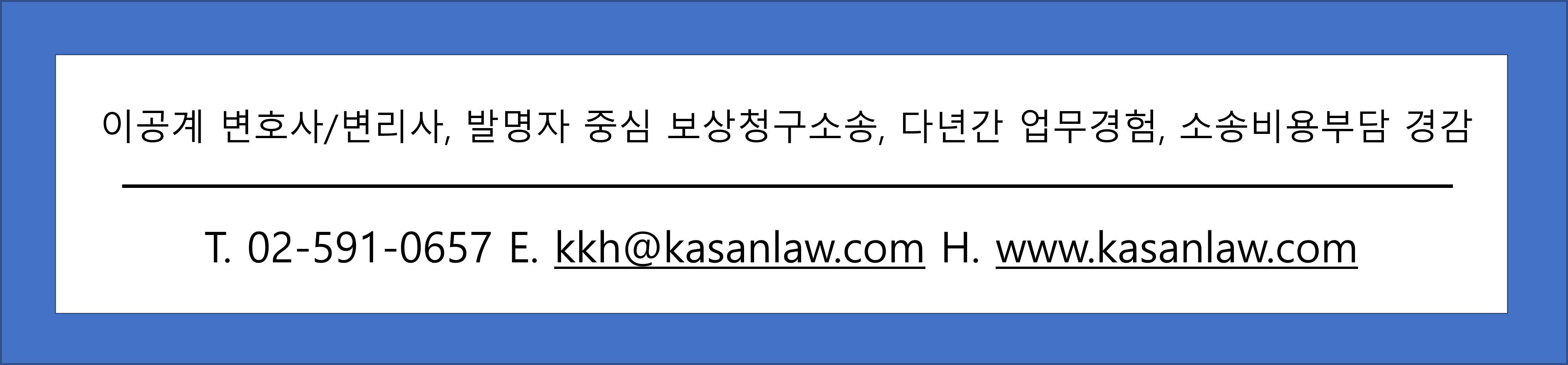(1)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금전 채권으로서 가분채권이기는 하지만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직무발명의 실시․양도 등으로 인한 향후 사용자의 이익액 등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단일하게 추산되는 금전채권으로서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에 발생한다.
(2) 사용자의 직무발명 실시기간을 나누어 실시기간 별로 구분하여 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시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3)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4)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 기판력은 그 일부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5)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6)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소송의 개시, 범위, 종결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한다. 채권자가 심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일부로 특정하여 청구함으로써 잔부청구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의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신뢰이익을 해친다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
(7) 그러나 채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하나의 가분채권을 수 개로 쪼개어 여러 법원에 제소하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제소하는 등 채무자에게 응소의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일부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잔부청구에 관한 후소의 제기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8)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발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피고 회사의 2018. 7. 29.까지 추정매출액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구하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이상,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발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일부청구로서 지급을 구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만 미칠 뿐이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9) 그러나, 선행소송의 확정된 판결에서 기지급 직무발명보상금이 이 사건 각 발명으로 인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 직무발명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
(10) 더욱이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중 선행소송의 청구금액 100,000,100원을 넘는 범위에서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데, 이 사건 각 발명으로 인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합계액은 70,321,036원으로 100,000,100원을 넘지 못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도 기각되어야 한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