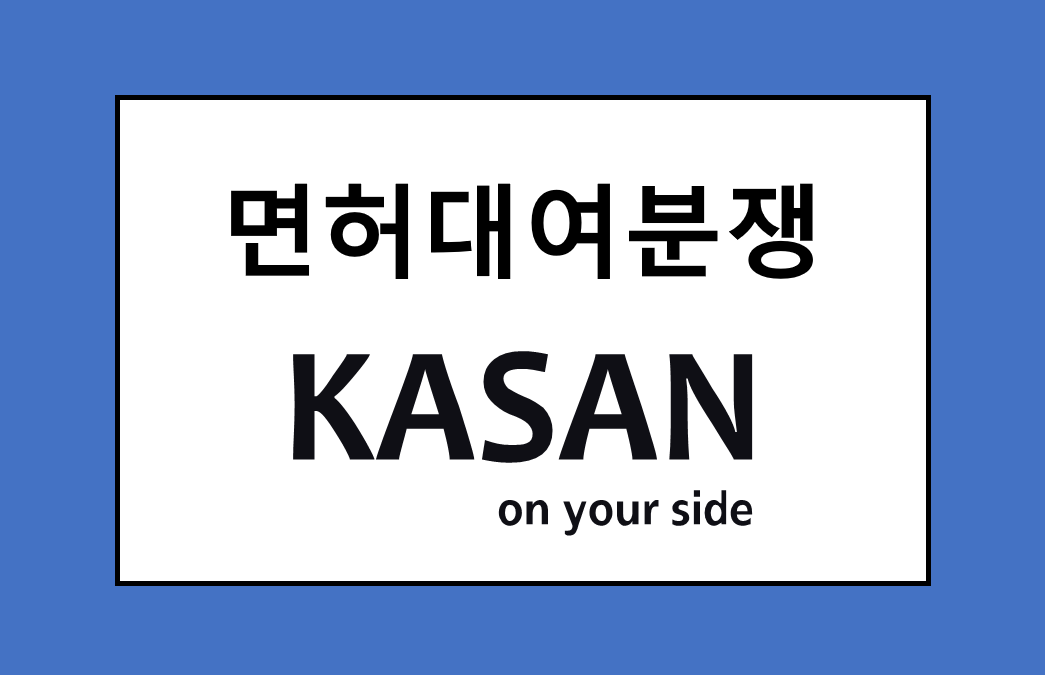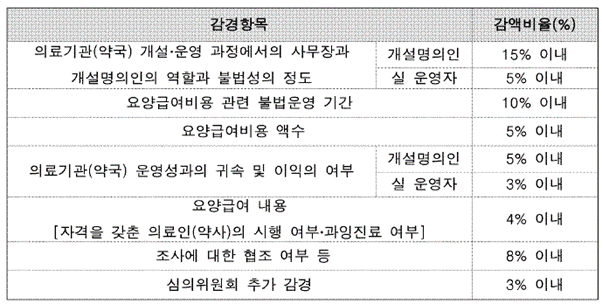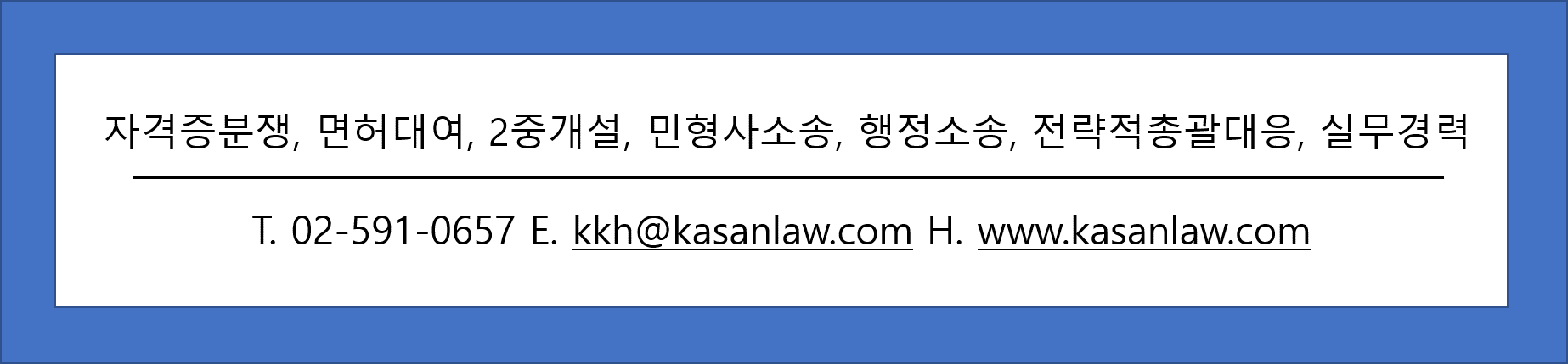(1) 수입화주 -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하였다는 관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2) 하급심 원심판결 – 수입화주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하였다. 유죄 판결
(3) 대법원 판결 - 피고인이 수입화주 등 지위에 있다고 보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 과정에 실제 관여하였거나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원심 파기·환송 판결
(4) 쟁점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 문제
(5)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