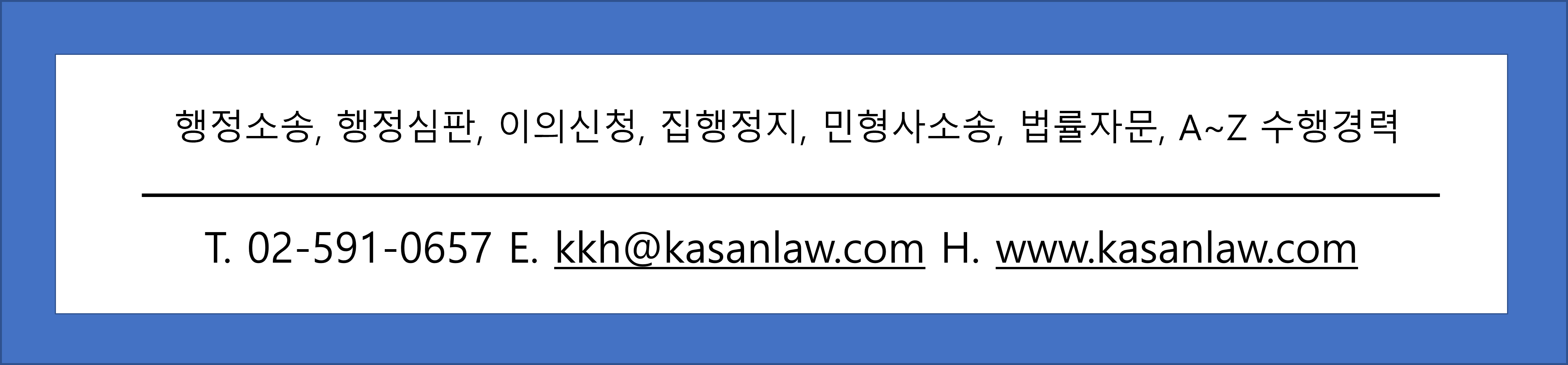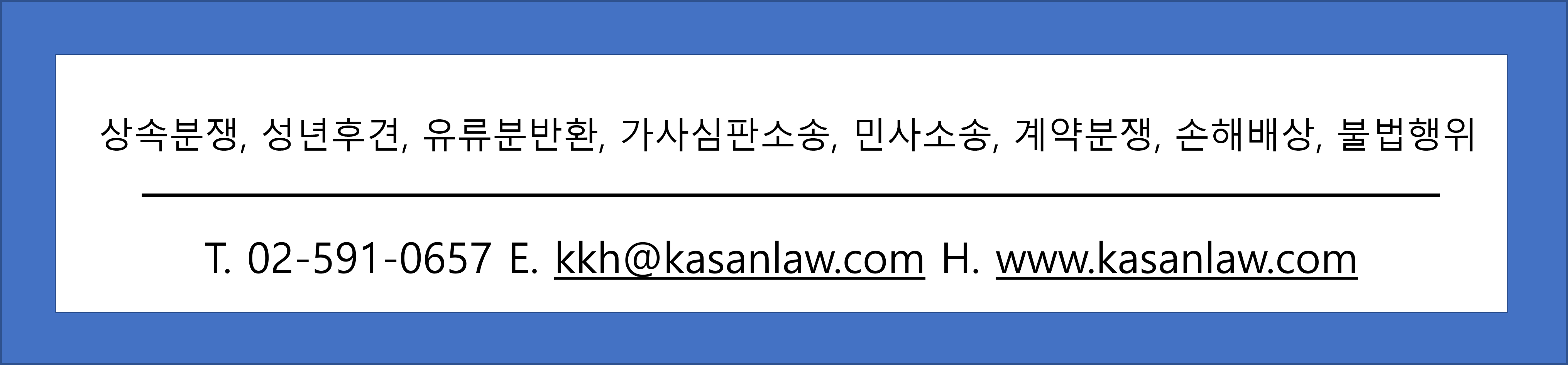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을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퇴직한 CTO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 특별결의(2003. 10. 26.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 벤처회사는 형식으로 응소하여 2007. 5. 4.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주총결의 무효판결의 대세적 효력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나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위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총결의는 벤처기업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고 할 수 없다.
3. 실무적 함의
사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닙니다. 즉,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문서만 갖춘 서면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서 경영분쟁이 발생하였고, CTO 등이 이탈하자 주주 1인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무효화하려는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잔류한 주주와 같은 편이었던 벤처회사에서 그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와 소송당사자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 및 퇴직자 등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나아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이미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므로, 결국 그 스톡옵션도 무효가 됩니다.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이라고 해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중대한 회사법상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른 정식 소집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여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결의를 확보해야만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통해 스톡옵션이 무효화되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 사례입니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