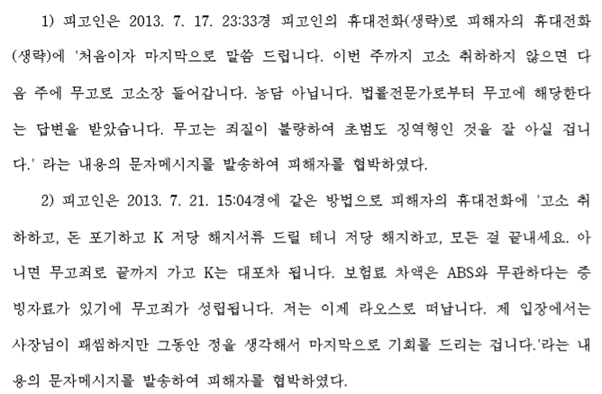1. 사안의 개요
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종교 등으로 갈등 중, 업무용 컴퓨터(PC)의 사내 메신저에 로그인(Log-in) 상태로 자리를 비운 사이, 허락 없이 몰래 피해자의 메신저 보관함 살펴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부서 상급자에게 발송함
2. 관련 법령규정 및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피고인 주장 요지 -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부당 입력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을 위한 행위나 적극적인 침입 행위가 없었다.
4. 대법원 판결요지 – 유죄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 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 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 전송을 거쳐야만 열람 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 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 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 전송과 저장 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 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 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 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첨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