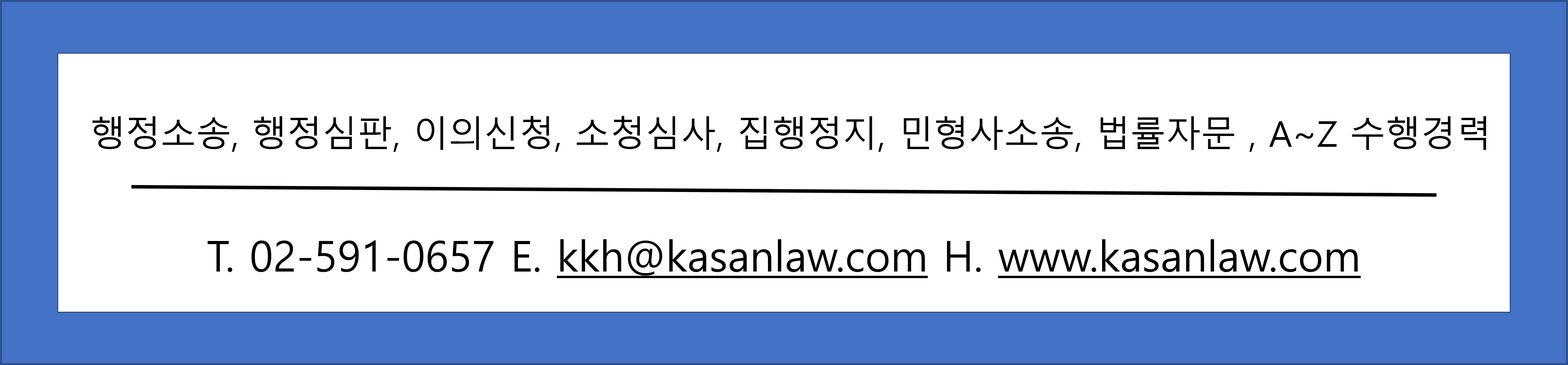(1)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행위를 처벌하는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2항에 ‘개설’이라는 문언만 존재할 뿐, ‘운영’이라는 문언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규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는 개설신고 이후에 동물병원을 관리․운영하는 일련의 행위 또한 포함된다.
(2)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
(4)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하면, ‘동물병원 개설행위’에는 동물병원 개설신고뿐만이 아니라 동물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동물진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수의사가 아니라 무자격자 피고인이 위 행위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면 사무장 동물병원 개설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면허의 차용행위는 타인의 약사 면허를 빌린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약사 업무를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고, 최초로 면허증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여를 허락받은 때에 차용행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면허증 등을 교부받은 이후에 타인 명의로 약사 업무를 하는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포괄하여 약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6) 약사가 재택근무 등의 방법으로 재직하였으므로 무자격자가 약사 면허를 대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부 출근하거나 약사 업무에 관여한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허대여 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노913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